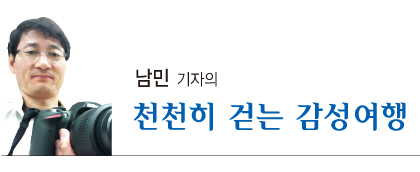 [헤럴드경제=단양]아이 못낳는 조강지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젊고 예쁜 첩은 사랑을 독차지했다. 처는 삐쳐서 등돌려 앉고 첩은 임신한 배로 남편을 향해 애교스런 눈빛을 주고받는다.
[헤럴드경제=단양]아이 못낳는 조강지처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젊고 예쁜 첩은 사랑을 독차지했다. 처는 삐쳐서 등돌려 앉고 첩은 임신한 배로 남편을 향해 애교스런 눈빛을 주고받는다.도담삼봉(島潭三峰)은 단양팔경 중 가장 동양적 정취를 풍기는 곳이다.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새벽, 저녁놀 어느 때 봐도 한 폭의 수묵화다. 여기에 간간이 나룻배까지 등장하는 날이면 환상적인 ‘그림’이 된다. 옛 선비와 묵객들이 찾아 풍류를 즐긴 단골장소였듯이 오늘날에는 사진작가들이 인내하며 ‘최고의 순간’을 기다린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불러모으는 명소다.
 |
| 도담삼봉의 운치넘치는 설경. 정자도 품위있어 보인다. 얼음이 꽁꽁 언 남한강은 관광객의 멋진 놀이터가 돼줬다. |
나는 이곳을 지난 연말과 올 초 이렇게 두번 찾았다. 처음 다녀와서는 한가지 풍경만 본 게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았다. ‘천의 얼굴’을 가진 도담삼봉의 극히 일부를 보고 얘기하기가 민망했기 때문이었다. 삼봉은 갈 때 마다 모습을 달리했다. 새벽 모습이 다르고 낮과 저녁에 각각 달랐다. 비오는 풍경 다르고 눈덮인 풍경 역시 달랐다. 물안개 핀 모습도 봐야 했고 일출과 일몰도 봐야 했다.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보려면 아마 열번은 와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와도 원하는 모습을 다 보기 어렵다. 날씨가 매번 변해줘야 이것저것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여줄듯 말듯한 이 도담삼봉이 ‘밀당(밀고당기기)’을 하는 연인 처럼 나에게 매력을 끈다.
나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단양문화원을 찾아가 선비들이 남긴 흔적을 더듬어 보완키로 했다. 단양에 올 때마다 늘 친동생 처럼 반겨주시며 팔경을 공부시켜주시는 이해송 선생님 손을 끌고 문화원으로 갔다. 처음 만난 이승오 사무국장은 금새 눈치채시고 팔경을 노래한 한시집(漢詩集)과 팔경을 창시한 퇴계 선생 책 등 무려 9권이나 쇼핑백에 담아 주셨다. 수려한 경치를 몸소 느끼고 그 흔적을 살펴봤고 1050페이지에 달하는 단양 한시집을 훑어 나갔다. 단양은 옛 선비들이 유난히 풍류를 즐긴 곳인데 이 한시집에는 조선시대 단양군수, 충청도 관찰사, 암행어사, 그리고 유람 온 선비 등 총 180명이 노래한 한시 1000수가 수록된 책이다. 그들의 생생한 숨결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 선생의 단양 생활상을 담은 책도 봐야만 했다.
 |
| 도담삼봉의 새벽 물안개. 신선이 내려올 것만 같은 분위기. 강물은 살짝 얼었다. |
도담삼봉은 단양읍내에서 남한강 상류 쪽으로 차로 5분 거리 강 가운데에 3개의 기암으로 우뚝 솟아있다. 바위도 마치 꼬깔콘(원추형) 처럼 생겨 재밌다.
3개의 바위 중 가운데 가장 큰 바위가 남편봉이다. 그런데 이 남편은 바람기가 좀 있다. 양 옆에 두 여인 바위를 거느렸다.
상류쪽 작은 기암이 처봉(妻峰). 그리고 하류쪽이 첩봉(妾峰)이다. 질투심에 가득 찬 처봉은 외로운 모습이다. 반대로 첩봉은 사랑받는 모습이 역력하다. 도담삼봉에 가면 이 모습은 꼭 확인해보자. 조선시대엔 첩문화가 흔했을 터이니 풍류를 즐기던 선현들은 이렇게 의미를 새기며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삼봉은 시인에게는 시상(詩想)을 안겨줬고 묵객에게는 그림이 돼 줬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진작가들에게는 멋진 피사체가 돼 준다.
그냥 바위 3개만 있으면 뭔가 부족했을 법, 마침 남편봉에 정자까지 있어 극한 운치를 자아낸다. 삼도정(三島亭)이다. 물안개에 휘감기는 새벽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이 정자에 걸터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풍류를 즐겼을 상상을 하니 이 보다 더 낭만적인 운치가 어디 있을까.
 |
| 도담삼봉의 화려한 설경. |
 |
| 도담삼봉의 또다른 얼굴. |
도담삼봉하면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을 빼놓을 수 없다. 정도전은 어린시절을 단양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의 소년시절은 불우했다.
이 아름다운 도담삼봉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정선의 삼봉산이 홍수에 떠내려와 이곳에 멈춰 도담삼봉이 됐다며 정선군에서 단양군에 이 삼봉을 즐기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단양군은 거절했고 양쪽이 화해의 실마리를 못 풀자 소년 정도전이 기지를 발휘했다.
정도전은 “우리가 삼봉을 떠내려 오라 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격을 가했다. 정선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다툼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도담삼봉에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된 정도전은 훗날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지었다. 지금은 주차장 광장 옆에 정도전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
 |
| 입구에 있는 정도전 동상 |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퇴계 이황 선생이 단양에 군수로 부임하면서(1548년) 도담삼봉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퇴계는 그 마음을 멋진 시로도 남겼다.
山明楓葉水明沙 / 三島斜陽帶晩霞 (산명풍엽수명사 / 삼도사양대만하)
爲泊仙橫翠壁 / 待看星月湧金波 (위박선사횡취벽 / 대간성월용금파)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 석양의 도담삼봉엔 저녁놀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 / 별빛 달빛아래 금빛파도 너울지더라”
이외에도 도담삼봉을 노래한 시는 무수히도 많다. 그 중 영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가 된 이종성(李宗城:1692~1759)은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로 빚은 도담삼봉이 진시황이 그린 영주산과 봉래산 보다 낫다고 노래했다.
도담삼봉은 선비들의 시심을 자극하는 원천이었다. 또 조선 화백 단원 김홍도와 최북, 이방운이 도담삼봉을 화폭에 옮겼고, 추사 김정희도 암행어사 시절 이 곳을 놓치지 않았다. 이들 묵객들은 같은 삼봉을 보고도 저마다 상상의 나래를 달리 한 작품을 남겼다. 조선 최고의 묵객들이 펼친 화폭을 견줘보는 것도 또다른 재미다. 오늘날 디지털기기 굴레 속에서 사는 우리들, 잠시 자연을 벗삼아 명상의 시간도 가져보자. 나는 오늘도 선현들이 서서 바라봤던 바로 그 풍광을 나의 시각으로 ‘느린 시간’을 즐겼다.
 |
| 도담삼봉이 조선 묵객들의 시각에 비친 모습. 왼쪽은 조선화가 김홍도 작품, 오른쪽은 이방운 작품이다. |
첫번째 방문때의 새벽 물안개 풍경과 달리 두번째 찾았을 땐 강물이 꽁꽁 얼었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경치가 일품이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삼봉에 다가가 즐겼고 나 역시 정자에 올라 누군가가 했을 법한 폼을 잡고 앉아봤다.
이런 천혜의 경치를 품은 도담삼봉도 아픔이 있었다. 충주호가 생기고 태풍이 몰아쳤지만 서울 수도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주호 수문을 마음껏 열지못해 이곳 정자까지 침수된 일도 있었다. 지금도 맑은날 자세히 보면 도담삼봉의 절반이 물에 잠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또 과거 두차례 정자가 태풍에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곳 기업 성신양회 회장이 든든하게 지어 군에 기증했다고 한다.
도담삼봉은 쫓기듯 급하게 들렀다 기념사진 몇 장만 찍고 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보여주지 않는다. 진정 삼봉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관찰하는 사람에겐 수줍어 할 속살, 황홀한 자태까지 선사한다.
터널 위 경사지의 정자는 이향정(離鄕亭)이다. 또 상류쪽 가파른 산 기슭에는 단양팔경의 또 다른 명소 ‘석문(石門)’이 있어 함께 둘러봐야 할 명소다.
……………………………………
■ 단양팔경 : 퇴계 이황 선생이 1548년(명종 4년) 단양군수로 부임해 천하의 이 아름다운 기암괴석 8곳을 보고 ‘단양팔경’으로 창시했다. 그 이전과 이후 조선의 선비들이 줄곧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했고 요즘도 단양관광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강 가운데 떠있는 도담삼봉과 이웃의 산기슭에 있는 동굴 처럼 생긴 석문, 남한강을 따라 우람하게 솟은 바위산 구담봉과 이웃의 옥순봉, 계곡의 내천에 있는 사인암과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이 그것이다. 모두 단양읍내에서 멀어야 12km 떨어진 곳에 있어 두루 관광하기에 편리하다.
■ 석문(石門) : 단양팔경 중 하나로 도담삼봉과 바로 이웃해 있다. 지형이 무지개 처럼 둥글게 떠있고 그 아래는 커다란 구멍이 난 것 처럼 뚫려 석문이라 부른다.
도담삼봉에서 상류쪽 산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오솔길을 잠시 걸어가면 있다. 5분 정도의 거리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귀찮다고 도담삼봉만 보고 그냥 가지만 꼭 보기를 권한다. 이 석문을 산쪽에서 바라보면 굴 밖의 남한강과 그 너머 도담리 마을의 전경이 마치 카메라 렌즈 속으로 바라보는 듯 아름답다.
 |
| 무지개 처럼 원을 그리며 뻥 뚫린 지형 석문이다. 뚫린 곳의 하얀 부분이 남한강의 눈이다. |
이 석문의 경치 역시 하도 아름다워 옛 선비들은 유명한 시를 많이 남겼다.
추사 김정희(金正喜)는 그의 완당집(玩堂集)에 ‘석문(石門)’이라는 제목의 멋진 시를 읊었다.
“百尺石霓開曲灣 / 神工千佛杳難攀 (백척석예개곡만 / 신공천결묘난반)
不敎車馬通來跡 / 只有煙霞自往還” (불교거마통래적 / 지유연하자왕환)
“백척의 돌무지개가 물굽이를 열었으니 / 신의 빚은 천불에 오르는길 아득하네
거마가 오가는 발자취를 허락하지 않으니 / 다만 연기와 안개만이 오갈뿐이네”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이해조(李海朝:1660~1711)는 석문이 있는 산을 중국의 별천지 구지산(仇池山)에 비유하고 돌부채가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노래했다.
구름다리 처럼 생긴 석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젠 위험해서 안오르는게 좋을 것 같다. 이곳은 카르스트지형이어서 언제 균열이 생겨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함께 간 이해송 선생님은 모서리 부분의 균열을 가리키며 위험을 알렸다. 나는 그럼 통행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까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곳 역시 전설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너무 황당한 전설이다. 옛날에 마고할미가 비녀를 잃어버린 후 찾기 위해 석문 아래를 긁었더니 아흔아홉 마지기의 논이 생겼다는 것인데, 요즘 듣기엔 좀 기가 막힌다.
글ㆍ사진=남민 기자/suntopi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