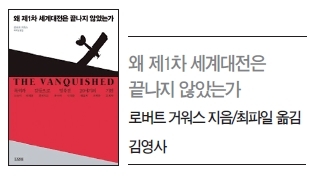
당시 무명이었던 ‘토론토스타’의 해외통신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 ‘스미르나 부둣가에서’의 한 장면으로, 오스만 제국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스미나르에 입성한 터키 군대에 의해 자행된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을 묘사한 것이다. 1차세계대전은 독일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끝났지만 폭력과 야만의 서막이 내렸을 뿐이었다. 오는 11월11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100년이 되는 날이다.
주목받는 소장역사학자 로버트 거워스 더블린 유니버시티 칼리지 교수는 ‘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는가’(김영사)에서 대전 종식 이후 새로운 폭력의 논리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또 한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현재의 갈등과 폭력적 상황을 낳았음을 밝힌다. 특히 1918년 대전의 공식적 종식과 1923년 터키 국경선을 확정한 로잔조약 사이, 전후 유럽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공간이 됐다. 그 중에서도 패전국 지역은 폭력적 격변을 겪었다,
지은이는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에서 불어닥친 가혹한 볼셰비즘에 대한 공포를 지목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볼셰비키 혁명과 그에 반대하는 혁명이 거듭되면서 혼돈으로 치닫는다. 저자는 이런 지속적인 위기의 체험이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1917년과 1920년 사이에 무려 27차례나 폭력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히틀러는 사회주의에서 극우로 전향한다. 무솔리니 역시 혼돈의 정치 속에서 질서와 규율을 앞세운 반민주적인 선동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지은이는 무엇보다 이 시기 새로운 폭력의 논리에 주목한다. 다름아닌 민족·종교에서 이질적인분자, 즉 내부의 적을 없애고 동질적 민족공동체를 수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극단적 폭력은 정당화됐다. 특히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내부 분열에 대한 강박은 전체주의·인종주의와 결합, 민간인 학살을 낳았으며, 이후 유고내전의 ‘종족 청소’로 이어졌다.
1917년 밸푸어 선언 역시 승전국의 일방적인 영토 재편에 따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을 제공했다.
1차세계대전이 뿌려놓은 분쟁과 폭력의 씨앗이 100년을 거쳐 어떻게 유럽을 흔들어놓았는지 잔혹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