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더 올리자” 이런 주장도 기자가 꺼내긴 민망하다. 아니나 다를까. 농축산업계 등의 의견을 빌어 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엔 으레 “얼마나 더 얻어 처먹으려 이리 악을 쓰며 난리냐”는 반응이 따라붙는다. 이게 ‘김영란법’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한 여론의 태도다.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한 적이 있었던가.
“돈을 더 올리자” 이런 주장도 기자가 꺼내긴 민망하다. 아니나 다를까. 농축산업계 등의 의견을 빌어 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사엔 으레 “얼마나 더 얻어 처먹으려 이리 악을 쓰며 난리냐”는 반응이 따라붙는다. 이게 ‘김영란법’을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한 여론의 태도다.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기사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한 적이 있었던가. 나를 돌아봤다. 18년 기자생활 동안 매주 2~3일 술을 마셨고, 그중 절대 다수는 출입처 사람들과 했다. 나의 기자생활의 3분의2는 기업들을 출입했다. 산업부, 경제부, 건설부동산부, 증권부 등이 그동안 내가 맡아 왔던 부서다. 기업을 맡았으니 기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줄 사람,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알고 있거나, 좌우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주요 취재원이었다. 나보다 연령대가 높은 임원급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활동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들고 다녔다. 맞다. 그들과 어울리며 남의 회사 법인카드로 참 많이 얻어먹고 다녔다.
기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인 게 가장 좋다는 거다. 가까워도 안되고 멀어도 안되는 관계다. 그래도 사람 사이 관계라는 게 생각처럼 되진 않았다. 그중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기고, 사회생활의 선후배 관계로 발전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들을 통해 회사나 업계의 은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가끔 남들이 쓰지 못하는 단독보도(특종)를 하기도 했다. 그들 중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꽤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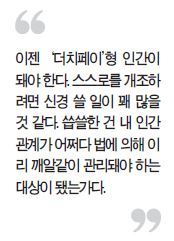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요즘 사회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이런 나의 관계를 다시금 반추하고 있다. 나도 그들에게 생일 케이크나 선물을 보냈고, 가끔 1차를 내기도 했기에 떳떳하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솔직히 어디까지나 주로 얻어먹는 쪽은 나였다.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얻어먹은” 대가로 부당한 짓을 한 적이 있었나? 부정청탁을 받아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를 쓴 적은 없었나? 처음부터 ‘더치페이’로 만났으면 더 좋은 관계가 됐을까? 난 아직도 해답을 잘 모르겠다.
다만 앞으론 그들을 만나면 “n분의1로 하시죠”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은근슬쩍 “돈 많은 선배가 내시죠”라고 해선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칫 나뿐 아니라 그들까지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어서다.
기자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청탁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다. 인간 관계라는 게 일률적으로 명확히 딱 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란 점도 강조하고 싶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있는 오래된 친구도 있고, 후배를 만나면 무조건 자기가 사야 직성이 풀리는 넉넉한 선배도 있다.
어찌됐든 나는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더치페이’형 인간이 돼야 한다. 그 대상이 누구건, 부정청탁 여부과 상관없이 'n분의1'을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번은 내가 사고, 다음엔 다른 사람이 사고, 어떤 때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고, 어려운 사람은 아예 안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더이상 꿈꾸지 말아야 한다. 그냥 심플하게 더치패이 원칙만 따르면 뒷말이 없을 것이다. 씁쓸한건 내 인간관계가 어쩌다 법에 의해 이리 깨알같이 관리돼야 하는 대상이 됐는가다.
jumpcut@heraldcorp.com








